密會
蕙園 申 潤 福 作
「침침한 달빛아래 밤은 깊어가는데 양인의 심정은 양인만이 안다네」 라고 畵題를 쓴 작자 혜원의 본뜻을 헤아려 나는 이그림에 밀회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다. 반드시 밀회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희미한 새벽 반달아래 초롱을 들고 남몰래 걷고 있는 한쌍의 젊은 연인들의 정감이 너무나 간절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야겠다.이 화제로만 미루어 보더라도 한 쌍의 연인을 양인이라고 불러온것은 이미 옛날부터 였으며 개화 이후에 새 풍조를 타고 크게 유행했던 노래 장한몽 가사 속에서 「대동강변 부벽루에 산보하는 이수일과 심순애는 兩人이로다.」한 양인이란 낱말도 따지고 보면 하등 새로운 말이 아니였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한쌍의 부부를 兩主라고 불렀고 양인이란 말은 이렇게 항쌍의 연인이란 뜻으로 흔하게 쓰여졌던 모양이지만 왜 그런지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양인이라는 묘한 매력을 지닌 낱말의 맛이 한층 은근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그림의 작자 蕙園 申潤福은 원래 18세기 후반기 英 - 正祖시대의 畵員이던 申漢枰의 아들로서 가업을 이어 山水와 인물을 그리던 작가였다. 그 무렵의 화가들이 대개 중국그림의 본보기나 화보 따위를 놓고 흉내내며 그 亞流的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던 당시 현실적인 한국의 서민생활을 주제로해서 생생한 서민사회의 인간상, 특히 도회적인 세련을 몸에 지닌 男女群像의 멋과 낭만을그리기에 정열을 기울인 단 한사람의 작가가 바로 이 蕙園이었다.
혜원의 이러한 풍속화 작품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마치 조선왕조시대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살어나간 멋과 가락과 즐거운 사랑의 생태를 그의 작품속에 집약해서 「한국멋」의 定型을 밝혀주려고 세상에 나왔던 사람이 아닌가 싶을때가 있다.
말하자면 만약에 이 蕙園의 畵業이 없었다라면 우리 사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民族美의 재산 한모퉁이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혜원이 이러한 작품에 정열을 기울이던18세기 말 무렵은 때마침 조선왕조사회가 어렴풋이나마 사회근대화의 먼동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대로서 천주교를 통해서 파급되어오는 서양의 과학기술이 지식인들을 자극해서 事實求是를 표방하는 실학파의 학문이 일어나고 서민사회의 자아인식이 비롯되어서 춘향전을 비롯한 서민문학의 발달을 보이는 시대였었다.이러한 사회배경속에서 누구보다도 민감한 지성적인 미술가의 뇌리속에 싹트는 새로운 감흥은 드디어 우리 미술사상에 처음되는 俗畵의 발생을 보게했던것이다.
당시 속화라함은 俗世間事를 다룬 그림을 가르킨 말이며 事大慕華的이던 그 시대 화단풍조속에서 이러한 속화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선구자적인 蕙園의 풍모를 역력하게 보여준것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어쨋던 혜원은 점잖지 못하다는 俗畵에서 그의 면목을 발휘했으며 이들 작품에 쏟은 애정의 농도로 보아 스스로 누를 수 없는 감흥의 도가니 속에서 절절하게 그려냈던 것이라는 느낌이 깊어진다. 필시 혜원은 그 스스로가 풍류남아였음이 분명하고 또 스스로 그러한 멋과 사랑과 낭만속에 몸을 적시지 않고서는 터득할수 없는 간절하고도 오묘한 사랑의 생태가 그림속에 그렇게 생생할수는 없을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던 밀회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 작품속에 생동하는 조선왕조의 낭만의 아름다움은 지금 시속 젊은이들 가슴에도 아직 싱싱하게 작용해 오는 한국인의 아름다움이 절절하게 스며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1969. 1. 12 < 崔 淳 雨 >
달빛을 마시는 「兩人」.... 生動하는 庶民의 浪漫과 情熱의 가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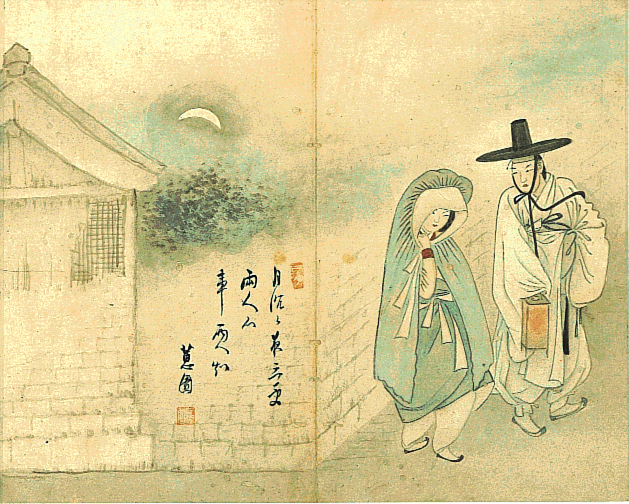
'♬있는風景'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랑의 테마/ 박인수.이수용 (0) | 2008.06.18 |
|---|---|
| 다시 보는 빨강구두아가씨-빅브라더즈 (0) | 2008.06.17 |
| 檀園 大展 - 禽獸. 翎毛. 花鳥. 四君子 中에서 (0) | 2008.06.17 |
| 미꾸라지 이명박을 끌어내자,,, 3박4일 ‘촛불잔치’ 선포 (0) | 2008.06.11 |
| 광장을 열었다 촛불을 공유했다,,, ‘아크로폴리스’가 된 서울광장 (0) | 2008.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