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시(詩)를 쓰는 사람,
그래서 화가이고 시인인 한희원(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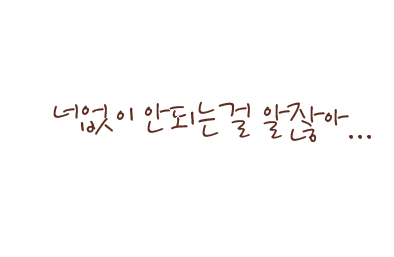

사람 사는 이야기가 땟국물처럼 스며있으며
자연 속에 풀어헤쳐진 후미진 풍경이 아스라이 열려있다.
감히 한 마디도 던지지 못하여도, 끝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의 울림이
화면에 번져 보는 이의 가슴에 파장을 일으킨다.
노란 은행나무가 그리도 곱고 땅바닥을 기는 채송화 한 잎이 핏물처럼 붉을 줄이야.
온통 감성의 날과 올을 건드린다.
온몸이 한없이 따뜻해져 오고 흥분되며 호흡이 가라앉는다. 침잠(沈潛)이다.
원래 시인의 꿈을 가졌던 문학청년으로 작품마다 문학적 여운이 강하다.
본인은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지만 그림이 완성되면
애절한 그리움과 서정의 물결로 넘실대는 한 편의 시가 연상되는 것이다.
한희원의 화면은 어둡다.
음울한 듯하면서도 빛과 어둠의 극적 대비는 격렬한 시각적 충돌로 시선을 빨아들였다.
쫙 가라앉고 쓸쓸하면서도 담백한 느낌을 준다. 그리움 그득 자아낸다.
근본에 대한 그리움이 자신도 모르게 화면 상하좌우에 흐르는 것이다.
한희원 그림의 대상은 자연과 함께한 사람의 흔적이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흔하디흔한 것을 그린다.
집과 마을, 길, 나무, 꽃, 바람, 강 등이다.<마을>은 옛 추억의 공간이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서의 집과 집들이 어우러져 이룬 마을의 온기를 품는다.
특히 밤이 내린 마을의 불 켜진 창문을 통해 인간미 따뜻함을 그린다.
그 마을 위로 뿌려진 듯 뜬 별들은 그리움이다.
개인적 소외도 깃들었지만 사람들 모두가 털어내어 외로움을 벗어나고픈 소박한 노래이다.
어린아이 눈에 가득 찬 눈물처럼 그렁그렁 쏟아질듯 화면을 채운 별들.
그리운 사람들의 눈망울처럼.한희원의 그림 속 <꽃>은 다르다.
화병에 곱게 꽂혀 실내공간을 장식하는 꽃이 아니다.
동백꽃과 백일홍, 채송화 등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뚝뚝 흘리거나
토해낸 핏덩이 같은 꽃잎들이다.
검붉은 땅바닥에 흩어지거나 흐려진 형태로 안개 속 같은 몽롱함도 있다.
그는 "무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싶을 때 꽃을 그린다"며 음유시인다운 속내를 보인다.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색상에 매료돼 여인의 혼을 대하듯 한다"고
어느 글 후기에 쓰기도 했다.
<강>은 상처난 별빛의 영혼 껴안기이다.
살아가면서 겪는 숱한 생로병사의 질긴 연줄로 하여
가슴에 쌓여든 깊은 상처를 위무하는 세례라고 할까.
푸르디푸른 강물에는 역시 사람의 흔적이 떠 흐르고,
별빛과 그림자들이 버무려져 있다.
한희원은 <길>을 좋아한다.
강과 길은 무엇인가 흐르는 통로이고 생명의 공간이다.
물론 구불구불 시골길, 골목길, 논두렁길이 가로질러 나있다.
길을 오래 그리다 보면 그 자체로서 추상적 그림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였던가. 97년에는 일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강을 따라 걷기도 했다.
강가로 난 길을 따라 섬진강 탐승을 했다.
이 기행은 학교를 그만 두고 그림에 전념하는
에너지가 되었다고 한다.
근작들에서 관심 있게 보이는 건 <나무>와 <바람>, <안개>다.
<나무>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한다.
한 사람의 인생처럼 홀로 선 나무의 표정과 시공간에 무한한 애정을 갖는 것일 게다.
또 나무를 그리는 것은 바람의 흔적을 줍기 위해서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시각적 감흥으로 뿜어내는 작가만의 창의적 내면을 살짝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무와 바람과 안개, 강물이 섞이면서 한희원의 그림들은 어느새 고적한 명상공간으로 변했다.
마치 수묵화(水墨畵)와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이다.
보면 볼수록 깊게 빠져드는 동양적 서정성의 신비감마저 감돈다.
실제 그의 그림은 표면에 드러나는 형체나 대상은극히 제한되고 단조롭다.
하지만 그 화면 속에는 앞서 언급한 집과 사람과 마을과 별빛들이 그려져 있다.
칠하고 또 칠하는 덧칠 방식으로 아래에 묻히는 것이다.
마치 심해의 저 깊은 바닥으로 서서히 침전하듯
세월과 추억, 흔적들이 가라앉는다.
침잠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깊고 정결하며 고요한 세계로의 이름인가.
그렇게 하여 마음을 비우는 공허, 욕심을 버린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침잠된 상태에서 영혼을 맑게 해주고 '없는 듯 있는' 허허로운 영적 공간을 그림에 열어놓는다.
그래서 근작에서 쓰는 색이 '괴색'이다.
더욱 단색화되고 침잠되어 '없는 색'인 괴색의 마력에 그는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지금 한희원은 괴색과 안개의 조화로 가장 침잠된 화면 연출에 몰입돼 있다.
붓질을 강하게 쓰기도 하지만 그리면 그릴수록 속으로 그림이 들어가는 독창적인 작업이다.
색을 빼면 수묵화의 느낌으로 우러나는 그의 작업은
결국 보는 사람과 명상적 교감을 시도한 듯 보인다.
현실에서 울컥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참고 참아 버텼더니
미지의 향수에 빨려들 듯 영혼의 울림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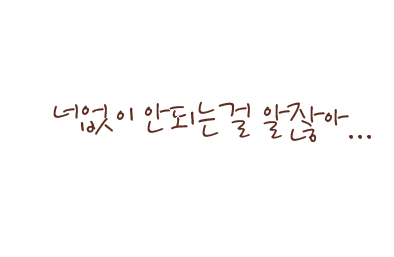

*글: 김옥조(미술평론가, 광남일보 문화부장)*

 은빛바람
은빛바람
 은빛바람2
은빛바람2
안개바람 (2001)


 안개와 바람 (2003)
안개와 바람 (2003)
늙은잎이 있는 나무


 내 영혼의 빈터 (1999)
내 영혼의 빈터 (1999)
가을의 기도 (2002)


 두 그루의 밀감나무 (2001)
두 그루의 밀감나무 (2001)
바람을 따라 걷다 (2002)


 바람과 나무 (2002)
바람과 나무 (2002)
바람을 따라 길을 걷다 (2002) 

 별과 바람과 나무 (2003)
별과 바람과 나무 (2003)

푸른바람 속으로 (2003)

 푸른바람 (2003)
푸른바람 (2003)
푸른비 내리는 강변 (2002)

 플라타너스에 떨어진 별 (2003)
플라타너스에 떨어진 별 (2003)
푸른바람 (2002)

별 내리는 강변에서 (1999)

 찔레꽃 (2003)
찔레꽃 (2003)

채송화 (2000)

선운사 동백꽃 (2002)

 사과꽃 향기 (2001-2)
사과꽃 향기 (2001-2)
달처럼 서러운 찔래꽃 (1998) 

 도라지 (1995)
도라지 (1995)
여수로 가는 막차 (1993)

 별 내리는 신창동 (1995)
별 내리는 신창동 (1995)

떠나는 사람들의 가을 - 첫사랑 (1998)

 교회당이 있는 마을 (1995)
교회당이 있는 마을 (1995)

달빛

 프라타나스와 별
프라타나스와 별

- 산당화꽃이야
 곱지~
곱지~ 


 별과 나무와 바람
별과 나무와 바람
큰 참나무 아래

바람과 비가 끝없이 내리고
그는 말이 없었네
세월이 그대 슬픔의 깊이만큼 오래도록 쌓여도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침묵으로 서 있었네
어느 날 그의 침묵 속에 큰 고독과 자유와 절망이
한꺼번에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슬픔이
순정한 고독과 자유가 하나의 의미였다는 것을
깊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은 땅 속 깊이 뿌리박고
 땅 속 깊은 전설과 하늘의 신화를
땅 속 깊은 전설과 하늘의 신화를 언덕 위 홀로 서 있는 늙은 나무에 기대어 보면
언덕 깊은 구렁에 묻어둔 마을의 전설을 들을 수 있다.
어떤 날 바람에 세차게 부는 날이면 나무는
세상 사람을 향해 가슴에 쌓여둔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바람 부는 날,
바람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의
우연이든지 아니면 필연이든지 간에
그냥 식물로서의 존재가 아닌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
숲 속에 무리지어 있는 나무보다 언덕 위나 강변
그리고 길 위에 홀로 서 있는 나무에 더 마음이 갔다.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들의 숙명적인 모습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좋아하고 그렸다.



'♬있는風景'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hris Isaak - Shadows In A Mirror (0) | 2007.03.24 |
|---|---|
| 쥬세페 아킴볼도 (0) | 2007.03.22 |
| 정봉길의 작품 (0) | 2007.03.22 |
| 원성스님의 작품세계 (0) | 2007.03.22 |
| <브루스의 진수>Luther allison (0) | 2007.03.22 |